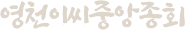분묘(墳墓) 및 비석(碑石)
- 등록일
- 2019-09-30
- 작성자
- 사이트매니저
- 조회수
- 528
- URL
소재지 :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 506-2
하풍산(河豊山)은 충간공 자암 이민환(李民寏)공의 묘가 있는 곳으로 원래 산운(山雲) 인근 청로리(靑路里)산에 있었으나 공의 외손 이관징(李觀徵)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 시에 친손들과 함께 영양읍 감천리 하풍산(河豊山)으로 이장하였다. 묘역에 들러서 보면 이와 같은 오묘한 지형이 있을 수 있나 하고 탄복할 정도로 가히 영양의 명당이라고 한다.
주위의 산지는 개간하면 곧장 옥전(沃田)으로 변할 수 있는 토질이기도 하여 옛날에는 노송(老松)이 울창하였던 자리이나, 지금은 수만 평의 산전을 일으키고 있다. 묘역을 감싸고 있는 유연(悠然)한 산 흐름을 감돌고 있는 감천의 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는 근접할 수 없다.
위로는 선생의 5대 조모 의인(宜人) 춘천박씨, 부하(祔下)에는 공의 2子 창호(菖湖) 정숙(廷橚)공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 옛날 머나먼 이곳에 이장하는 큰 공적을 쌓았기에 선생의 후곤(後昆)들이 그렇게 번성한 지도 모를 일이다.
〈參考文獻〉-《永川李氏淵源과 그 世系》·《우리고장 山雲마을》·《永川李氏世譜》
[충간공 자암선생 신도비명 병서(忠簡公 紫巖先生 神道碑銘 幷序)]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옥(李沃) 찬(撰)
우리 아버지의 외조부인 고 형조 참판 자암(紫岩) 이공(李公)께서 돌아가신지 45년이 되었으나 비석이 없다며. 그 후손 중염(重燫)씨가 가장을 나 옥(沃)에게 주며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빛나는 덕을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데 그대만한 이가 없을 듯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 그대가 도모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공께서는 문행과 치적이 있고 지위 또한 경(卿)의 반열이며, 나 또한 외손이 되니 의리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삼가 살피건대 공은 휘가 민환(民寏)이고, 자가 이장(而壯)이며, 본관은 영천(永川)인데. 상조 휘 박(磚)은 고려 영동정(領同正)이다. 증조 휘 세헌(世憲)은 진사로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 휘 여해(汝諧)는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휘 광준(光俊)은 강원도 관찰사로 예조참판에 추증되었다. 3대가 추은(推恩)을 입은 것은 공의 부자가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妣) 정부인 평산 신씨(平山申氏)는 장절공 숭겸(崇謙)의 후손이며 선무랑 권(權)의 따님이다. 만력 계유년(1573)에 공께서 나시었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함이 뭇 아이들과는 달랐고, 문사를 일찍이 통달하여 10세가 되기 전에 《춘추(春秋)》 대의를 꿰뚫었다.
임진년(1592 선조25년)에 왜구가 침략으로 흉봉(凶鋒)이 날마다 치열하여 여러 고을이 무너졌다. 공과 중씨 경정공(敬亭公)이 엄공(嚴公 학동공(鶴洞公)을 따라 강릉 임소에 나아가 군사를 모으고 병기를 손질하며 대비하였다. 이웃의 무지한 백성이 적을 이끌고 격문(檄文)을 가지고 와서 뵙고자 하였는데 공이 곧 아뢰고 목을 배었다. 적이 이르자 공이 말을 달려 나가 몇 사람의 적을 쏘아 죽이니, 적들이 두려워 감히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여 이웃 고을에 많은 도움에 되었다. 공의 당시 나이가 20세였다. 도신(道臣)이 조정에 알려 엄공께서 통정(通政)의 품계로 올려졌다.
경자년(1600)에 과거에 급제하고 승문원을 거쳐 예문관에 들어갔다. 당시 경정 공께서는 춘방(春坊 세자시강원)에 계셨는데, 형제가 휴가를 아뢰고 관동 감영에서 엄공을 뵈었다. 옥절(玉節)에 채색 옷을 입고 함께 금강산에 모였는데, 간이(簡易)·최립(崔岦)과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수령으로 따라가 기록하고 글을 썼으니, 세상에서 삼소(三蘇)가 촉(蜀)나라 다리에 대하여 지은 것에 비교된다고 하였다. 세자시강원사서·사간원정언·병조좌랑과 홍문관수찬에 등용되었다.
을사년(1605)에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2등에 녹훈되었다. 암행어사로 왕명을 받들고 관서 지방을 순무(巡撫)하여 지방관이든 아니든 사사로움 없이 상벌을 내렸다. 왕자 집안에 있는 포악한 노비의 횡포가 심하여 수령도 감히 어찌된 일인가 묻지를 못했는데 공이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무신년(1608)에 군(郡)으로 나오기를 청하여 영천(永川)에 나왔고,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였다. 중주(中州 충원(忠原) 현감에 제수되니, 고을은 상유(上游)에 있었는데 땅이 넓고 풍속이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었다. 공께서 위엄과 자애로 구제하여 한결같이 관리라도 백성처럼 다스려 조정 권세가의 청탁을 물리치니 호좌(湖左)에서 제일로 다스려 졌다.
광해10, 무오년(1618) 7월 후금의 요동 침공 시,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강홍립을 도원수(都元帥)로 공을 문종사관으로 참전하게 되자 공이 말하기를, “평탄하고 위험하며 죽고 살고를 돌보지 않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라고 하였다. 이듬해 2월 우리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동갈령(東葛嶺)에서 명나라 군사를 만났다. 이보다 먼저 원수가 광해군의 밀지(密旨)를 받고 수서(首鼠)를 행해야 했다. 평양감사 박엽(朴燁)과 윤수겸(尹守謙)을 관향사(館餉使)로 삼았는데, 고의로 군량 운송을 늦추어 군졸들이 굶주렸으나 명나라 장수는 우리가 출발을 늦춘다고 꾸짖기에 원수가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다.
3월에 마가채(馬家寨)에 나아가 머물렀는데, 군졸들은 더욱 굶주렸다. 공께서 군량을 관장하는 군관을 참수하자고 청하고 박 엽과 윤수겸에게 편지를 보내 꾸짖었다. 지적한 말이 매우 엄하였는데 그들이 이때부터 공을 원망하였다. 3월 4일에 부차지(富車地)에 도착하여 갑자기 적을 만났다. 아군은 부황(浮黃)든 군사들로 굶주려 피폐한데 적은 10만의 강성한 군사이니, 진을 치기도 전에 무너졌다. 공께서는 자진하여 의롭게 순절하려 하였는데, 원수(元帥)가 적들과 화의를 성사시키려 하였고, 처음부터 오랑캐들이 단정하게 대하여 우리를 허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에 공은 계획한 일을 훗날에 도모하리라 하고 원수를 따라 갔는데, 적들은 온갖 수단으로 꾀이고 협박하면서 공의 부하장교 및 노비를 죽이고 위협하였다.
청의 회유(懷柔)에 불복한 선생은 오직 대의와 정도(正道)로 대치했다. 공은 칼날 보기를 편안한 자리와 같이 여기며 언사(言辭)와 안색(顔色)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앉을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였고 눕고 일어날 때는 인신(印信)과 마패를 지니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손수 서유(先儒)들의 글을 기록하여 강독과 암송을 그치지 않았고 그 책을 제목 하여 <조문록(朝聞錄)>이라 하니 중국인들도 듣고 공경을 마지않았다.
적에게 구류된 지 17개월 만에 공이 끝내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목패에다 구금된 자들의 이름을 쓰고 섞어서 뽑아 내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공의 이름도 그 목패 중에 있어 풀려나게 되었다. 이에 공과 함께 두 사람이 용만(龍灣)에서 돌아오니 박엽(朴燁) 등이 지난날 공이 자기를 꾸짖은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또한 공이 임금을 만나 장계를 저지한 것과 저들의 편지가 도달하지 않게 한 것을 아뢸까 두려워하여 조정을 끼고 은밀히 도모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공은 마지못해 도신(道臣)을 통해 인신과 마패를 바치고 관서(關西)에서 2년 간 머무르다 돌아왔다.
계해년(1623) 인조반정으로 인조대왕이 왕위에 오르고 공을 서용(敍用)하였다. 갑자년(1624) 이괄의 변고 때에 행재소(行在所)를 따라갔다. 정묘년(1627) 난리에 여헌(旅軒) 장 선생이 영남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공을 종사관으로 불렀다. 계유년(1633) 대동 찰방에 제수되고, 을해년(1635) 홍원(洪原) 현감에 제수되었다. 병자년(1636)에 또 호소사 막하에 나아가 난이 평정되고 군자감정에 제수되었다. 통정에 오르고 동래부사에 제수되어 엄하고 명확하게 다스려 번거로운 폐단을 없앴다. 교화를 돈독히 하고 선비들을 권장하며 청렴하고 진실하게 다스리니, 교활하고 속이는 자가 없어져 주변이 편안하여졌다. 신사년(1641) 장예원 판결사에 제수되고, 계미년(1643) 호조참의에 옮겨 제수되었다. 갑신년(1644) 형조참판에 제수되었으니 모두 특별한 명이다. 여러 직책에서 성한 치적이 있었다. 을유년(1645)에 경주부윤에 제수되니, 다스림이 중주(中州)•동래(東萊)와 같았다.
공께서 해마다 국은(國恩)을 입고 총애가 남달랐으므로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고자 맹세하였다. 연세가 많아 일을 맡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병가(病暇)를 내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기축년(1649) 2월 24일 병환으로 세상을 뜨시니 향년 77세이다. 임금이 제문을 내리고 부의를 보냈다. 이해 여름 의성 청로산(靑路山) 경향(庚向)의 둔덕에 장례 지냈다가 27년이 지난 을묘년(1675)에 영양 하풍산(河豊山) 갑좌(甲坐)에 이장하였다. 이곳은 우리 아버지께서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살펴 두었던 곳이다.
공은 처음에 광주이씨 생원 산악(山岳)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가 일찍 돌아가시었고, 후에 남양 홍씨 군수 구상(龜祥)의 따님에게 장가드니 아름답고 부인의 도리가 있었다. 모의(母儀)에 모자람이 없어 5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정상(廷相)은 문과에 급제하고 군수이며, 다음은 정숙(廷橚)이다, 다음 정기(廷機)는 문과에 급제하고 목사(牧使)인데 중씨(仲氏) 경정공(敬亭公)의 뒤를 이었고, 다음 정재(廷材)는 조졸(早卒)했으며, 다음은 정빈(廷彬)이다. 장녀는 우리 할아버지 증 찬성공 휘 심(襑)에게 출가했고, 다음은 사부(師傅) 박공구(朴羾衢), 다음은 판교 신홍망(申弘望), 다음은 사인 송세빈(宋世彬)에게 출가하였다. 아들 정지(廷枝)·정오(廷梧)는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고, 정주(廷柱) 는 음 선교랑, 정표(廷杓)는 생원이다.
정상은 아들이 없어서 아들 만흥(晩興)을 후사로 삼았고, 딸은 사인 신무(申堥)에게 출가하였다. 정숙의 4남에 맏이 중현(重炫)은 생원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고, 중렴(重燫, 중경(重熲), 중전(重烇)이며, 3녀는 사인 신이징(申以徵)·조진윤(趙振胤)·이향주(李享柱)에게 출가하였다. 목사(牧使)인 정기는 아들이 없어 중경(重熲)으로 아들을 삼았고, 5녀는 현감 윤선경(尹善慶), 사인 최경함(崔慶涵), 홍서규(洪敍揆), 장령 최경중(崔敬中), 정랑 유임중(兪任重)에게 출가하였다. 정재의 딸은 참봉 신명구(申命龜)에게 출가하였다. 정빈의 2남은 중형(重炯), 중익(重熤)이며, 2녀는 사인 최경유(崔慶濡), 최경만(崔慶漫)에게 출가하였다.
할아버지[李襑]의 2남에 맏이는 우리 아버지 휘 관징(觀徵)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판중추부사치사봉조하(致仕奉朝賀)이고, 다음 정징(鼎徵)은 학업을 닦았으나 일찍이 세상을 떠났으며, 2녀는 사인 윤이구(尹以久), 현감 이운근(李雲根)에게 출가하였다. 박공구의 2남은 원향(元享), 원영(元榮)이며, 4녀는 사인 조진창(曹震昌), 참봉 홍덕이(洪德彛), 진사 김상옥(金相玉), 사인 이도제(李道濟)에게 출가하였다. 신홍망의 아들은 한로(漢老)이며, 8녀는 사인 유중하(柳重河), 김시임(金時任), 진사 이조형(李朝衡), 사인 임세준(任世準), 도이설(都爾卨), 권휴(權烋), 박문약(朴文約), 현감 박망지(朴望之)에게 출가하였다. 송세빈 3남은 익(熤), 식(烒)은 진사, 후(㷞)는 무과에 급제하고 군수이며, 2녀는 사인 이휘(李暉), 진사 이달신(李達新)에게 출가하였다. 내외 증 현손을 합하여 4백여 명이 된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빼어나고 기상이 뛰어났으며 도량이 크고 넓었다. 시서(詩書)에 마음을 두었고 역사에 관통하여 고금의 변화에 통달하였다. 젊은 나이에 벼슬에 나아가 세상에 크게 쓰일 듯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역 땅에 매몰되어 구독(溝瀆)의 하찮은 의리를 따르지 않으니, 헐뜯고 비방하고 이간질 하며 공을 더렵혀 스스로 상쾌해하는 자가 넘쳐났다. 이 말을 들은 자는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전하는 말에 익숙하여 오래도록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성상께서 크고 밝게 보시어 발탁하여 경재(卿宰)로 삼으시고 회유(誨諭)하시기를 “사람들이 혹 말이 있으나 나는 실로 그대를 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모함하는 자들의 날카로운 말을 깨트릴 수 있고, 천만세토록 밝게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안으로의 행실이 갖추어져 친족 간에는 돈목하고 이웃 간에는 은혜를 베풀었으며, 선조를 받드는 제사는 예로써 하였다. 성현의 요긴한 말을 엮었으니,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禮]을 으뜸으로 하고, 사대(四代)의 예악을 행하는 것을 가운데로 하고, 우(禹)임금과 직(稷)이 도를 함께 한 것으로 끝을 삼아 제목을 ‘박약(博約),이라 하였다. 또한 향약(鄕約)을 만들어 자제를 가르쳤으니, 모두 후세사람들이 법으로 삼을 만하다.
내 늦게 태어나 소손(小孫)으로 비록 공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남의 선비들이 매우 높게 논하기에 감히 법가필사(法家拂士)에 공을 넣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명(銘)을 쓴다. 명하여 이르노니
문장이 있고 有文也
치적이 있고 有治也
하늘이 공에게 재주를 온전히 주어 天與公材具也
나라의 이로운 사람이 되었네 爲國家之利也
어찌 삐뚤어진 관을 허물하며 何郵之弁也
어찌 이지러지고 넘어지겠는가. 何騫而躓也
돌아와 명을 받았고 輸而納之命也
힘써 뜻을 이루었네. 捲而遂之志也
밝고 밝은 대명에 昭昭者大明也
남을 모함하는 자의 많던 말이 그쳤네. 彼坎人者之饒舌可己也
빼어난 산의 봉분은 英山之封也
신물이 보호할 것이네 神物之呵撝也
공에게 상고함이 있을지니 有考乎公也
어찌 이 석자 비석을 보지 않겠는가? 盍觀此三尺碑也
숭정(崇禎) 갑신(甲申) 후(後) 50년 계유(1693) 월 일
외(外)증손(曾孫)가선대부(嘉善大夫)호조참판(戶曹參判) 이옥(李沃)은 삼가 짓는다.
외(外)증손(曾孫)중직대부(中直大夫)공조좌랑(工曹佐郞) 이발(李浡)은 삼가 전서(篆書)를 쓴다.
〈參考文獻〉 - 《국역 紫巖先生文集 卷之8, 李沃 撰 神道碑銘》